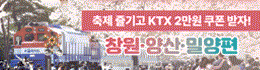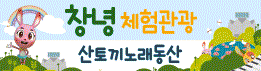함안군청 옆에 위치한 3·1운동기념탑.
◆함안읍 만세의거
함안군은 창원시(당시 마산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3·1혁명 당시 매달 음력 3일, 8일에 함안읍 장이 섰다. 이곳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만세의거 소식은 꼬리를 물고 들려왔다.
이때 조한휘, 한종순 등이 광무황제 인산(고종 황제 장례식)에 참예(參詣)했다가 만세의거를 겪고 독립선언서를 숨겨 돌아왔다. 이들은 지역 유지들과 비밀회동을 거듭한 후 거사일을 3월 19일(음력 2월 18일)로 정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드디어 장날 오후 2시 태극기를 높이 든 인물을 선두로 약 3000명의 민중이 만세를 부르면서 행진해 들어갔다. 이때 일제 경찰이 출동했으나 의기충천한 민중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민중은 드디어 함안주재소롤 쇄도해 갔다.
이곳에서 경찰을 지휘하던 마산경찰서장 기타무라(北村淸澄)가 오만한 태도로 나오자 격분한 민중 1000여명은 도끼와 곤봉, 돌 등을 들고 주재소로 들어가 기물을 부순 후 경찰에게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면서 만세를 부르라고 한 후 서장에게는 ‘독립만세공명(獨立萬勢共鳴)’의 증명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민중은 다시 군청으로 가서 군수 민인호를 붙잡아 제복과 제모를 벗긴 후 같이 만세를 부르라고 한 후 군수를 앞세우고 시위를 했으며, 평소 민중을 가장 괴롭히던 등기소로 몰려가서 이를 파괴하고 우편국과 일본인 소학교도 습격했다.
오후 5시 40분께 마산 중포병대대와 일제 경찰이 증파되면서 맨손과 맨주먹으로만 저항하다 보니 한계를 맞았다. 민중이 물러서자 일제 군경은 주요 인물을 검거하기 시작해 이튿날까지 65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겨 43명이 6개월~7년 형의 옥고를 치렀다.
◆군북 만세의거
이튿날 군북 장날, 함안읍 만세의거에 참가했던 조상규, 조용효 등은 비밀연락을 통해 군북 의거에 많은 민중이 호응하도록 호소했다. 민중들은 일전을 각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장꾼을 가장해 속속 군북 장터로 모여들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군북 장터에서 가까운 사립 신창학교 교정에서 약 50명(일제군 기록 약 30명)의 학생과 민중이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군북주재소에 파견됐던 마산 중포병대대와 경찰이 급히 이곳으로 출동해 이들을 해산시켰는데, 오후 1시가 되자 군북장에 모인 민중은 약 3000명(일제군 기록 약 2000명)으로 늘어났다. 민중의 위압에 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들은 공포를 발사했다. 위기를 면한 일제 군경은 주재소로 철수했다.
오후 5시께 의분을 참지 못하던 민중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 그 수는 약 5000명(일제군 기록 약 3500명)을 헤아리게 되자 일제 군경은 공포를 발사했다. 민중은 여기에 투석으로 대항해 주재소 유리창이 부서지고, 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렸다. 마침내 일제 군경은 민중에게 실탄을 퍼부었다. 이날 총탄에 의한 순국자는 조용효, 이원필 등 21명이었고, 박상엽 등 1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의거로 조상규 등 수십 명이 고문을 당한 후 옥고를 치렀다.
이후에도 만세의거는 계속돼 많은 희생자를 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선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유관순 열사 부모가 순국한 아우내장터 만세시위에는 19명이 순국했지만 함안 순국자는 227명으로 기록했다. 함안 의거의 규모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