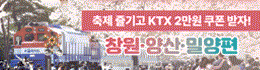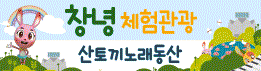진주성 내 영남포정사는 조선시대 경상남도 관찰사가 업무를 봤던 곳이다./문화재청/
한말 의병사 전무후무한 진주의병
1896년 2월 19일(음력 1월 7일), 진주관찰부가 의병에 의해 점령됐다. 임진왜란 때 왜군을 상대로 1년 이상 버티면서 진주성대첩을 이뤘을 정도로 내·외성이 굳건했던 진주성을 진주에서 170리나 떨어진 안의(현 함양군 안의면)의 의병들이 점령했다는 소식은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도 날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었다.
더구나 안의 출신 신암(愼菴) 노응규(盧應奎, 1861~1907년)가 이끈 의진은 그의 제자와 전 사과(조선시대 군직) 임경희, 안의 장수사 승려 서재기 등 14~15명에 불과한 의병을 주축으로 진주성을 장악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진주향교 장의였던 한진완 등 유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며칠 뒤 정한용(鄭漢鎔)이 진주 사람들로 구성된 의병을 일으켜 호응하자, 진주성을 점령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진주로 몰려든 의병이 1만명을 넘었다.
노응규·정한용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지 1개월도 안 돼 진주관찰부 관할 22군을 의병천하로 만든 진주의병은 일제 침략의 교두보였던 부산 진격을 위해 김해로 별동대를 보냈다. 의병들은 김해에서 4월 11일과 12일 접전을 벌인 끝에 일본군 4명을 살상시켰지만 의병 역시 4명이 전사하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진주로 철수했다. 이후 노응규는 서재기와 정한용에게 각각 육십령 고개 아랫마을인 안의와 대구로 통하는 길목인 삼가군(현재 합천군 삼가면)으로 보내서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토록 했으나, 4월 19일(음력 3월 7일) 의병해산령을 받자 의병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1897년 2월 국왕은 환궁해 그해 10월 12일(음력 9월 17일)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선포했는데, 황제 즉위 직후 노응규는 ‘지부자현소(持斧自見疏)’를 올려 우비(憂批 : 노응규의 처지를 근심하는 황제의 답변)를 받고 부형의 묘지 1000평과 묘전(墓田) 500평을 하사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노응규의 의병투쟁은 정당화됐고, 노응규 부형을 살해했던 안의의 서리들은 처단되고 부형의 장례를 치렀다.
의병장들의 공로를 인정해 그해 4월 정한용에게 시종원 분시어(分侍御)에 이어 시위대 1대대 부위(副尉)로 임명했다. 노응규는 1902년 규장각 주사, 경상남도 사검 겸 독쇄관, 중추원 의관에 올라 정3품이 되는 초고속 승진을 한 후 을사늑약 때까지 황태자의 비서실장 격인 동궁시종관을 맡았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노응규는 거의를 위해 사직하고 초계로 내려갈 때 광무황제는 그에게 비밀리 시찰사의 부인(符印)과 암행어사의 마패를 하사해 그를 격려했다. 그는 1906년 가을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분기점인 충북 황간(현 영동군 속면) 상촌면 물한리 직평으로 들어가 국권회복의 기치를 높이 들자, 황간 주민들의 협조로 의병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왜인의 밀고에 의해 황간의진 수뇌부가 체포되고 말았다. 황간의진의 총병력은 알 수 없으나 빈번한 이동과 다른 의진과의 합류 등으로 보아 상당한 인원수의 부대 편성이 있었다. 두 차례 일본군 척후대를 괴멸시켰으며, 문태서(文泰瑞)·이장춘(李壯春) 의진과 연합해 의병투쟁을 전개했다. 그는 1907년 1월 21일 충북 청산경무분서에 수감됐다가 한성경무감옥서로 이감되고, 음식을 끊은 지 2주일 만인 2월 16일(음력 1월 4일) 순국했다.
경남 의병과 3·1혁명, 의열투쟁 기록 사라지다
1949년 당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일제 앞잡이들의 방해 공작으로 무산돼 해당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관된 직후인 1949년 10월 27일 남로당 무리로 위장한 세력에 의해 진주법원의 기록물이 불타버려 수많은 의병 재판기록과 일제강점기 애국지사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모두 사라졌다. 국권회복기 진주법원의 의병재판기록 중 대구공소원에 공소한 기록만 존재하고, 공소를 하지 않은 수많은 의병들의 재판기록은 사라지고 말았다.
경남의병은 투쟁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전기의병 때 진주·사천·고성 의병이 1만여명이었다는 일제의 기록이 남아 있고, 후기의병은 1905년부터 경술국치 전후까지 수천명이었다. 당시는 부산과 울산도 모두 경남이었고, 경남도청 소재지는 진주였다. 특히 진주는 전국 4대 도시 중의 하나인데다가 배후 고을인 거창·곤양·단성·산청·안의·하동·함양 등은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산은 무려 40여개의 의병부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들 재판기록이 사라졌으니, 일제 앞잡이들의 반민족 행위와 함께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불을 지른 행위는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요, 천추의 한으로 남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