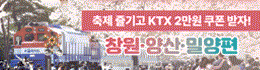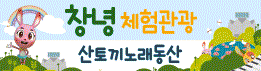밀양독립운동기념관 앞에 설치된 조형물.
밀양읍에서 만세의거 일어나다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언제나 비참한 슬픔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적 일본과의 투쟁을 한시라도 쉬어서는 안 된다.”
밀양사립동화중학교 교장 전홍표 (全鴻杓) 선생은 일제가 대한을 강점한 후 온 민족이 슬픔과 의분에 잠겨 있을 때 밀양읍 한 모퉁이에서 젊은 학생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외치면서 학생들에게 반일투쟁의 굳은 의지를 심어줬다.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시위를 겪은 이곳 출신 윤세주(尹世胄)·윤치형(尹致衡)은 귀향해 전홍표 선생의 지도를 받아 김병환(金餠煥)·이장수(李章守)·윤보은(尹輔殷) 등과 만세의거를 서둘렀다. 3월 13일(음력 2월 12일) 밀양읍 장날을 의거일로 정한 지도자들은 장꾼을 가장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품에 숨겨 장터로 잠입해 만세시위를 벌이자 수천 명(일제 군경 기록에는 약 1000명)의 군중이 밀양공립보통학교 앞으로 모여들었다. 윤세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벌였으나 일본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사람이 순국하고 부상을 입은 채 흩어지고 말았다.
격렬했던 단장면 만세
단장면 구천리에 있는 표충사(表忠寺)는 통도사(通度寺) 말사로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끈 송운대사(松蕓大師)(사명당)가 표충(表忠)이라는 시호를 받자 이를 기리는 표충사(表忠祠)가 있던 사찰이었다.
3월 20일, 통도사 승려 50여명이 표충사로 와서 그곳 승려와 비밀회합을 갖고 독립의거의 거사를 모의하게 됐다. 이른바 ‘표충사 의거’로 불리기도 하는 단장면 만세의거는 승려 이장옥(李章玉)·이찰수(李刹修)·오학성(吳學成) 등이 중심이 돼 의거의 준비를 서둘렀다. 이들은 거사일을 4월 4일 (음력 3월 4일) 대룡리(臺龍里)에서 열리는 단장면 장날로 정했다.
4월 4일, 표충사 승려와 학생 30명이 장꾼에게 태극기 수백 본을 나눠주고 만세를 부르자, 정오경에는 약 5000명(일제 경찰 기록)이나 모여 만세시위를 벌이자 일제 군경이 해산을 강요했다. 이에 군중은 주재소로 몰려가서 투석전을 벌였고, 일제는 밀양 헌병 분견대를 급파해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싸웠던 대표적인 대규모 의거였는데, 수십명이 순국하고 364명이 검거됐고, 이 중 71명이 구속 송치돼 혹독한 고문과 옥살이를 했다.
4월 6일에는 부북면에서 사립 계성학교 교장 김내봉(金來鳳)과 김성수 (金聖壽), 김응삼(金應三) 등이 중심이 돼 500여명(일제 경찰 기록 300명)이 만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는 밀양의 만세시위에서 105명이 순국했다고 기록했다. 밀양만세의거는 김원봉(金元鳳), 윤세주, 김대지(金大池), 황상규(黃尙奎) 등이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는 계기가 됐다.
(경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