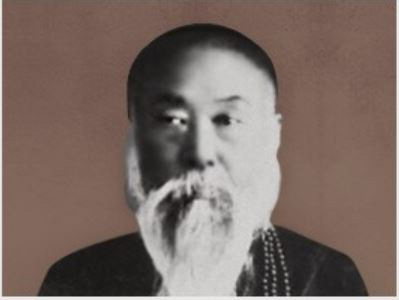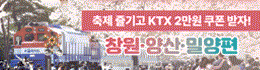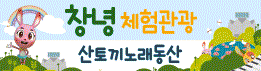조국광복 위해 대종교에 입교하다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강탈하기 직전인 1909년 10월, 서울의 보성중학교 교장 박중화(朴重華)를 중심으로 신민회 소속 청년들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동청년당(大東靑年黨)이라는 비밀결사조직을 결성했다. 얼마 후 고령의 남형우(南亨祐), 밀양의 윤세린(尹世麟), 안동의 김동삼(金東三), 의령의 안희제(安熙濟) 등을 중심으로 영남 일대의 우국지사 80여명이 참여해 그 인원이 120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윤세린은 경남·북을 오가며 큰 활약을 했는데, 그는 1903년부터 6년 동안 고향인 밀양읍의 신창학교와 대구의 협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해 동지와 제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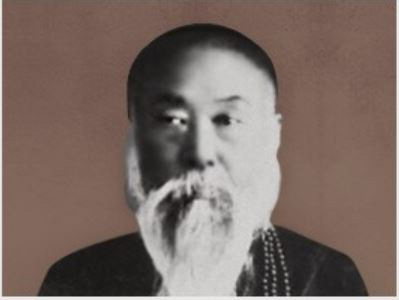
윤세복 선생
윤세린(1881~1960년)의 본관은 무송(茂松), 자는 상원(庠元), 호는 단애(檀崖)이다. 밀양군(현 밀양시) 부북면 무조리 만석꾼 윤희진(尹憘震)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 윤세용(尹世茸)과 함께 한학을 수학했다.
그는 경술국치 후 홍암(弘巖) 나철(羅喆: 본명 나인영) 선생이 단군을 숭상하는 대종교(大倧敎)를 창시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조국광복을 꾀한다는 소문을 듣고 홍암을 찾아갔다.그는 대종교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름도 조국광복의 의지가 담긴 세복(世復)으로 바꾸고, 단애라는 도호를 받았다. 포교활동을 통해 조국광복을 도모하자는 홍암의 제의를 받아들여 형 윤세용과 같이 가산을 정리, 서간도 지역으로 향했던 것이 1911년 2월이었다.
만주 땅에서의 광복활동과 모진 감옥생활

1946년 대종교 총본사의 서울 환국을 기념해 찍은 사진.
서간도 환인현에 도착한 단애 선생은 우선 학교를 세워 단군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광복을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해 서간도 환인현 서문 안에 동창학교(東昌學校)를 설립해 대종교 포교와 민족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선생 일행이 이주한 무송현 백두산 기슭에는 이미 백산학교(白山學校)를 설립해 이주 한인들의 자제들을 상대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던 전성규(全星奎) 등이 있었다. 두 학교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장래의 무장투쟁을 위한 광복군(독립군)을 양성했다.
1918년 11월(음력), 선생과 김교헌·김규식·김동삼·김좌진·박은식 등 39인이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해 기미년 3·1혁명의 기폭제가 됐고, 대종교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의정원 의원 29명 중에서 대종교 원로가 21명이었고, 의장에 선출된 이동녕과 주요 직책에 임명된 13명 중에서 11명이 대종교 원로였다.
1923년에 대종교 제2세 교주인 김교헌이 사망하자 이듬해 초에 제3세 교주의 책임을 맡아 시종일관 대종교를 통해 반일민족의식 고취에 진력했다. 1934년에는 하얼빈시에 나가 대종교 선교회를 설치해 많은 동포들이 대종교 교당을 찾아 단군성조의 위덕을 추모하면서 민족정신을 가다듬게 했다.
1942년 11월 일제는 국내의 조선어학회 사건과 때를 같이해 소위 ‘잠행징치반도법(暫行懲治叛徒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선생을 비롯한 김영숙·나정련·서윤제·안희제·윤정현·최관 등 대종교 지도자 20여명을 체포해 모진 고문을 가한 후 액하감옥(液河監獄)에 투옥시켰다. 이들 중 10명이 옥사하는 임오교변(壬午敎變)이었다. 선생은 무기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겪다가 광복으로 출옥했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자 총본사가 부활됐고, 1946년 2월 환국해 서울에 설치했다. 미군정 때 대종교는 유교, 불교, 천도교, 기독교 등과 함께 5대 종단의 일원으로 등록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제1호 종단으로 등록했으며, 개천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대종교에서는 선생을 제3세 도사교(都司敎)이자 초대 총전교(總典敎)이며, 단애종사(檀崖宗師)로 호칭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2001년 2월)로 선정했다.
김길수 (경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