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있는 간이역] 새 한 마리- 김복근
- 기사입력 : 2022-09-29 07:40:20
- Twe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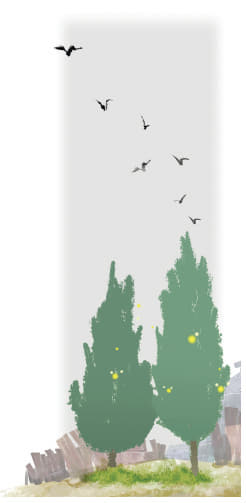
미루나무 가지에
새 한 마리 날아왔다.
새 한 마리 무게만큼
가지가 휘었다.
미루나무 가지에
새 한 마리 날아갔다.
새 한 마리 무게만큼
가지가 펴졌다.
휘고 펴진 가지 사이
조그마한 바람이 일고 있다.
☞새는 가벼움의 상징이다. 날갯짓 만으로 하늘을 날 수 있으니 몸이 가볍고, 어디든지 훨훨 날아갈 수 있으니 마음도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 새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이 동시를 읽고 알았다.
그러고 보면 생명은, 모든 삶에는 무게가 있다. ‘새 한 마리의 무게만큼 가지가 휘는’ 미루나무는 새의 무게를 안다. 미루나무는 새의 무게만큼 휘었다가 펴지며 그 무게를 내려놓기도 한다. 새들이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날아갈 때까지 나무는 과묵하다.
새가 날아간 다음에야 나무는 새를 위해 한숨을 흘린다. ‘휘고 펴진 가지 사이 조그마한 바람이 일 때’, 나무는 새를 대신해 울기도 한다. 나무가 우는 것은 바람 때문이라기보다 그 작은 새들의 삶의 무게를 아는 탓 이리라.
새와 나무를 바라보는 시인의 눈이 꾸밈없는 아이 같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가는 과정이 담백하고 단아하다. 행과 행 사이에서 미풍이 일어 독자의 마음을 가볍게 두드린다.
- 김문주(아동문학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