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 해상 카페서 바라본 낙조.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공상에 잠기듯 바라봤다. 어두운 밤에도 바다는 계속 일렁이고, 잔잔한 파도가 일었다.
가을이다. 잎과 꽃이 짧고 먼 비행을 시작한다. 내려앉는 마음이 지켜온 마음을 넘어설 때 계절은 바뀐다. 올해 추석은 보기 드문 황금연휴였다. 이번 연휴에 나를 포함한 삼남매가 아침부터 당일치기 사천여행을 다녀왔다.
사천 방면으로 가는 길에 진주 정촌 강주마을을 찾았다. 이팝나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채웠다. 이팝나무는 대대로 참기름을 주로 짜는 방앗간이었다가 몇 년 전 식당으로 바뀌었다. 꽃이 흰 쌀밥처럼 피어나는 이팝나무 이름 그대로 식사는 비빔밥만 팔고 있다. 이팝나무는 카페를 겸하고 있는데, 강릉 테라로사 원두를 가져와 커피를 내려준다. 남해안의 한 카페에서 전국적으로 커피 맛을 알린, 강원도 커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진주 강주마을 이팝나무 육회.
10월 초 강주마을은 여름이 아직 묻어나는 가을 연못이 있다. 이팝나무 바로 앞 강주연못은 물을 거의 보기 힘들 만큼 연꽃으로 꽉꽉 들어차 있다. 연꽃과 수련은 꽃이 피면 연분홍과 샛노랑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지만 개화 전까지는 외관이 비슷해 구별이 어렵다.
연꽃은 잎이 물에 젖지 않고 송글송글 이슬 닮은 물방울이 맺히는 반면, 수련은 발수성이 없어 잎이 물에 잘 젖고 만다. 연꽃의 수명은 멀고 아득해, 2000년 묵은 종자가 발아한 일도 있다고 한다. 물안개를 꽉 붙잡은 강주연못은 멀리서 보면 단정하고, 가까이 보면 어지럽다. 이팝나무 창가에서 연꽃들이 하나의 군락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다가가면 아기 하나를 감쌀 만큼 넓은 잎이 같은 모양 하나 없이 제각기 다른 키와 얼굴을 하고 있다.

진주 강주연못
우리는 나무다리로 강주연못을 가로질렀다. 다리 위에서 사방을 살피면, 초록 잎에 둘러싸인 격리감을 준다. 물안개를 움켜쥔 초록이 주는 안정감은 왜인지 따뜻하고, 연잎의 어지러운 행렬은 뒤섞인 이불처럼 아늑하다. 시기를 놓쳐 직접 보지 못한 연꽃은 분홍의 우아한 꽃을 피우면서 처연한 기분을 준다고 한다.
여행 동안 드문드문 이슬비가 밀담 나누듯 내렸다. 다음 목적지는 사천읍성이다. 오래된 읍성을 거점으로 잡목들을 잘 가꾸어 수양공연을 함께 만든 곳이다. 이곳은 내비게이션으로도 정확한 입구를 찾기 힘들어 인근에 도착해서 사람에게 길을 묻는 편이 수월하다. 사천읍성은 임진왜란 때 사천사람들과 함께 수모를 겪으면서 왜적을 몰아낸 곳이다.
이제 역할을 다하고 좋은 휴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사람은 모진 세월을 흘려보내주고, 공간은 세월을 쌓아가며 유적이 되곤 한다. 사람은 없이 비에 잘 젖고 있는 옛 성곽과 함께 몸집을 이룬 수양공원은 어느 지역에서나 하나쯤 있을 풍경이다.

사천 수양공원
이끼는 성벽의 등을 쓸어주듯 자랐고, 축축한 숲길을 걸으면 발소리에 고요가 반응했다. 나무에 걸린 훌라후프, 칠 벗겨진 운동기구, 수도꼭지를 덮고 종아리 높이까지 자란 잡풀들. 정이 붙지 않을 만큼의 손길만 남기고,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은 채 공원은 고즈넉한 기운으로 만연했다. 사천읍성은 여행지답게 즐겨내야 할 긴장감을 이루지 않아 좋았다.
한껏 진지하면서 무겁지는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울리는 음악처럼 소박한 분위기였다. 돌담길과 녹음 사이를 지나 성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잠자리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는 두 아이가 있었다. 티격태격한 모습이 남매 같았다.

사천읍성
읍성은 내내 적막하고 여유롭다. 우리 같은 여행자가 다녀가면 읍성은 한동안 또 혼자일 것이다. 여유가 길어지면 외로움이 들기 쉽다. 외롭게 침묵하는 읍성에서, 남매는 지친 일상에 보기 드문 좋은 일처럼 왁자지껄하게 지나갔다.
소설가 김영하는 경주와 통영여행에서 피자를 먹었다고 한다. 고집스러우면서 신선하다. 울진에서 대게를 먹는 일과 포항에서 과메기를 먹는 일보다, 울진에서 피자를, 포항에서 피자를 먹는 것은 같으면서 분명 다른 일이 아닐까.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 지역에서 먹어보는 것도 좋은 여행의 기술이라 여겨졌다. 당연 바다로 여행을 왔으면 회나 해물을 먹어줘야지 하는 공식을 깨는 일. 의식하지 못한 고정관념을 깨는 행동이 바로 여행의 시작이 아닐까. ‘사천에서는 횟집!’이라는 공식을 깨고 우리는 사천지역에서 유명한 중국집을 다녀왔다. 어느 집의 짜장은 달고, 어떤 집의 짜장은 너무 짜다. 우리의 머리색이 모두 같은 검정이 아니듯이 짜장면도 같은 검정이지만 모두 다른 맛을 가진다. 이렇게 여행음식은 같은 사물들에서 사소한 차이를 건져내는 매력이 녹아 있다.
낙조는 너무 아름다운 꿈처럼 진다. 바다에서 주황, 노랑, 분홍구름을 만들고 시드는 낙조를 끝까지 지켜본 날이면 삶은 가끔 영화 같고, 아쉽게 돌아가는 밤공기는 단편소설 같다. 사실 이번 여행의 본 목적은 사천 실안 낙조를 지켜보기 위함으로 집을 나섰는데, 계속 하늘이 흐려 여행 내내 걱정이었다.

그러나 6시쯤 활짝 개는 저녁이 기적처럼 나왔다. 끝을 알 수 없는 물결 범벅에, 누가 발로 찬 듯 빨강이 쏟아졌다. 바다는 낙조를 구경 온 사람들로 붐볐다. 사천 해상 카페를 찾아온 사람들과 노을을 맞았다.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공상에 잠기듯 바라봤다. 느릿느릿 하루를 건너가는 해를 보고 있으면 왠지 말 못한 하소연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기분이 든다. 습기에 웅크린 하루를 보상해주듯, 비가 막 그친 깨끗한 하늘에는 노을이 피어났고, 아주 잘 익은 풍경 앞에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 다녔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기 힘들다. 실안 낙조 앞에서 사람들은 수없이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가 귀한 시절에는 사진을 기념으로 찍었다. 요즘 사진은 기념보다는 기록으로 찍힌다. 인생에 길이 남을 사진은 여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온통 깜깜해지고 나서야 우리도 자리를 떴다. 어두운 밤에도 바다는 계속 잔기침하듯 일렁이고, 잔잔한 파도가 맥박처럼 낮게 뛰었다. 낙조를 끝으로 당일치기 사천 여행은 끝이 났다. 지는 해와 바다의 입맞춤에서, 사위어가는 오늘의 쓸쓸함에서, 무언가 시작됨을 알아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생각을 했다.
사천에서 우리는 바쁜 일상이 무사히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빈둥거림을 다하고 왔다.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삼남매의 여행은 끝이 났다. 각자, 만족할 만한 삶이 채워지는 순간순간을 충분히 느끼길 바랐다. 어떤 여행 명소를 가든지 굳건하게 자기 먹고 싶은 음식을 고집해 먹듯이, 생활에 침전되거나 휩쓸리지 못할 유속으로 자기 세계를 유지하며 지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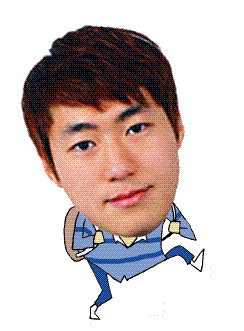
△ 김진백
△ 마산 출생·경남대 재학
△ 2015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2024년 04월 16일 (화)
- 경남신문 > 라이프 > 청춘과 떠나는 세계여행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짜리 집 사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짜리 집 사도 ‘1주택자’ 창원시, 오리엔탈마린텍에 행정처분 재통보
창원시, 오리엔탈마린텍에 행정처분 재통보 진주, 사천, 밀양, 고성, 합천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진주, 사천, 밀양, 고성, 합천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특별 인터뷰]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특별 인터뷰]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올 1분기 경남 ‘음주운전’ 1965건… 토요일 밤 10~12시 ‘최다’
올 1분기 경남 ‘음주운전’ 1965건… 토요일 밤 10~12시 ‘최다’ 환율 뛰고 유가 들썩… 경남 경제계 ‘중동발 악재’ 촉각
환율 뛰고 유가 들썩… 경남 경제계 ‘중동발 악재’ 촉각 거창 ‘북상초 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 7가구 입주
거창 ‘북상초 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 7가구 입주 여행 꿈 싣고… ‘경남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16일부터 출발!
여행 꿈 싣고… ‘경남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16일부터 출발! 경남의 웹툰 스타 ① 웹툰의 산실 ‘경남웹툰캠퍼스
경남의 웹툰 스타 ① 웹툰의 산실 ‘경남웹툰캠퍼스 [만나봅시다] 취임 1주년 맞은 성낙인 창녕군수
[만나봅시다] 취임 1주년 맞은 성낙인 창녕군수
















